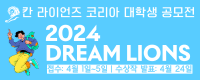"플랫폼에 구애받지 않는 꽂히는 콘텐츠 발굴할 것"

소비자의 눈이 머무르는 곳이 곧 광고가 되는 시대다. 과거엔 TV가 가장 강력한 흡인력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지만 최근엔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TV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광고 시장에 매진해 온 종합광고대행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되고 있다.
뉴데일리경제 브랜드브리프팀은 최근 디블렌트 본사에서 전수경 디블렌트 콘텐츠마케팅 본부장을 만나 변화하는 종합광고대행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전수경 본부장은 서울비전의 음악감독과 키이츠서울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광고업계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봐왔다. 그는 올 초 디블렌트에 신설된 콘텐츠마케팅 본부에 합류하면서 변화의 최전선에 섰다.
전 본부장은 "콘텐츠마케팅 본부는 TV광고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게 아니라, 전체 광고 캠페인의 모든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업무를 맡는다"며 "TV, SNS, 옥외광고, 오프라인 프로모션 등 영역이나 플랫폼을 나누지 않고 캠페인을 주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총체적으로 구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광고대행사는 TV, 디지털, 프로모션 등 각 부문별로 업무를 맡고 규모가 작은 SNS 콘텐츠는 대대행을 맡기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예를 들면 TV광고는 빅모델을 써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라디오는 전문 성우를 써서 녹음하고, SNS는 대대행을 맡겨 인기있는 카드뉴스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디블렌트는 콘텐츠마케팅본부를 중심으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위주의 연간 대행을 하는 광고주에게만 제공하던 SNS 마케팅을 이제 다양한 광고주를 위한 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 대대행을 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A부터 Z까지 광고주가 집행하는 캠페인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

전 본부장은 맥도날드 '삼천원송', e편한세상 광고 음악을 비롯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성화 봉송 주제가 'Let Everyone Shine' 등을 만든 업계 최고의 음악감독이자 인스타그램에선 2만3000여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로 유명하다.
그는 광고 음악은 물론, SNS에 올리는 개인적 일상과 업무, 취향, 라이프스타일까지도 사람들을 소위 '꽂히게'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다.
전수경 본부장은 "광고 음악은 소비자들의 귀에 확 꽂히는 음악을 만들어 그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들고 인식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결국 형태만 다를 뿐 광고음악도 광고의 목적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비전 음악감독 당시 광고 기획부터 제작, 편집 등 모든 파트의 과정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플랫폼이나 영역에 구애받지 않는 꽂히는 콘텐츠를 다방면에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SNS를 한글 타자로 치면 '눈'이 된다. 소비자의 눈은 TV를 넘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눈이 무언가를 많이 본다면, 광고대행사는 빠르게 이를 따라가야만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도 이같은 흐름을 인지하면서 TV 광고비를 줄이고, 디지털 광고와 SNS에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며 "디블렌트는 이러한 광고주를 위한 촘촘한 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